臺灣韓國學研究 2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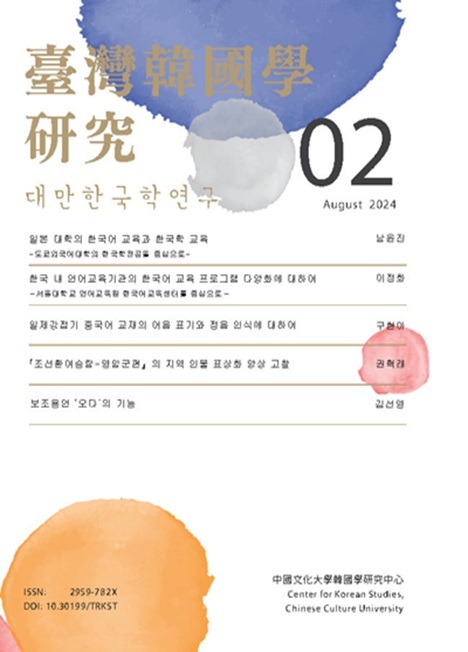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교육 −도쿄외국어대학의 한국학전공을 중심으로 - 남윤진
초록
본고는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현황을 한국어 교육의 기반 형성과 한국학 연구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개관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내실을 기하
기 위한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학 교육의 양적 측면을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실시된 「일본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소개한다.
다음으로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도쿄외국어대학의 한국학 전공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소개한다. 이에는 다른 여러 외국어와 동일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한국 국외의 외국어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는가 하는 측면이 조명된다. 또한 한국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어려운 인적, 환경적 조건을 어떻게 메워나가고 있는지,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원 및 교직 과정의 운영 상황이 어떠한지도 다룬다.
주제어
일본 대학, 한국어 교육, 한국학 교육, 도쿄외국어대학
한국 내 언어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 이정화
초록
본 논문은 한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한국 내 언어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 역사는 어느덧 60년 이상 되었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어 교육 기관과 학습자의 수가 물리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 전보다 많이 다양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의 방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고급 수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토픽시험의 최고급 수준인 한국어 6급을 합격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한국어 수준을 원하는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6급 수준을 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둘째, 학습 동기와 교육 목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위탁 기관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탁 기관들의 요구가 전보다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규 프로그램 외에 선택반을 운영하거나 앱이나 온라인 영상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세세한 요구나 학습 능력 차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검토를 통해 그간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 과정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고찰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고급 수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교육 목적 다양화, 선택반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의 어음 표기와 정음 인식에 대하여 - 구현아
초록
일제강점기는 중국과의 교역, 독립운동 전개, 이주 등의 목적으로 중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 편찬된 중국어 교재는 사역원에서 편찬된 역학서와는 달리, 서양식 인쇄 기술로 중국어의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일본어나 영어로 내용을 번역하며, 가타카나, 알파벳으로도 주음하고,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자모를 조합한 새롭고 다양한 표기를 사용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 출현한 성모, 운모, 표기의 새로운 표기를 나열하고, 사역원 편찬의 중국어 역학서와의 다른 표기법 특징과 음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북경관화를 표준음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음했는데,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서는 북경관화이 표준음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와 같은 표준음에 대한 기술은 이 시기 중국어 교재에서 본격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한국의 중국어 교재 역사상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는 형식, 내용상의 전환을 보여준다. 본고의 연구결과가 중국어 교육사 및 중국어사를 총체적이고 면밀하게 밝히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중국어 교재, 일제강점기, 가타카나, 알파벳, 북경관화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의 지역 인물 표상화 양상 고찰 - 권혁래
초록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은 1930~40년대에 유학자 충남 공주 출신의 이병연(李秉延)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사찬(私撰) 읍지이다. 이 논문에서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의 사찬 읍지로서의 특성 및 내용에 대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에는 영암 세거 가문의 인물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주(延州) 현씨(玄氏)의 가문 인사들이 20대에 걸쳐 40명이나대거 등재되어 있다. 이는 사찬 읍지 영암군편의 편찬과정에서 1930년대 호남지방의 대표적인 경제인 현준호가 출판비를 후원하면서 조상 현양을 위해 영향력을 미친 것과 상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 ‘삼강오륜’ 편에는 열녀 24명의 삶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남편사망 뒤 행동에 따라 생존형, 사망형,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생존형은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이 살아서 가족봉양 및 자녀교육 등의 행위를 한 유형이다. 사망형은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도 죽음을 택함으로써 사랑 및 절의를 표한 유형이다.
셋째, 영암군편의 편찬자는 백제인 왕인 박사와 통일신라 도선국사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기술하면서 이들을 영암군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로 현양하려는 의도 를 드러냈다.
주제어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 이병연, 연주 현씨, 현준호, 열녀, 왕인, 도선
초록
‘오다’의 기능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기본 의미를 설정하고 이것이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렇게 파생적 의미로 설명하는 데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본고에서는 ‘오다’의 기능이 서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발달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이 서로 다르며 본용언 ‘오다’의 문법화된 의미 특성이 각기 다름을 들었다. 첫 번째 기능 ‘과거로부터의 지속’을 나타내는 ‘오다’의 경우 동사와 두루 결합하며 존재형용사나 태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기능에서 본용언 ‘오다’의 이동의 의미는 시간적 이동으로, 화자를 착점으로 하는 의미는 현재나 현재 이전의 시간적 착점으로 문법화되었다. 다음으로 ‘점진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오다’의 경우 증상 형용사와 심리 형용사와의 결합이 두드러지며 빛이나 색 등의 자연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성상 형용사와도 빈도 높게 결합되었다. 동사와의 결합에서도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증상, 심리 등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용언이 지닌 이동의 의미는 점진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나 착점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착점의 초점화’를 나타내는 ‘오다’의 경우 발화 동사나 의미적으로 발화와 관련을 맺는 동사와 두드러진 결합 관계를 맺는다. 이 기능에서는 이동의 의미는 사라졌으며 착점의 의미는 행위 대상을 향한 방향을 나타내는, 착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이동, 착점, 시간 지속, 상태 변화, 방향성
ISSN: 2959-782X
DOI: 10.30199/TRKST
